고사성어
[ 권토중래 - 捲土重來 ]
우암
2022. 4. 4. 10:02
( 말 권 / 흙 토 / 거듭 중 / 올 래 )
"흙먼지를 말아 일으키며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패한 적이 있는 자가 세력을 키워 다시 쳐들어 온다는 말이다.
< 출 전 > 두목(杜牧)의 시(詩) / 오강정(烏江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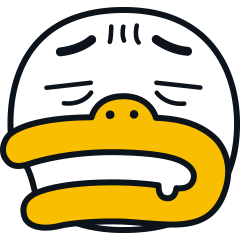
초패왕 항우(項羽)와 한 왕 유방(劉邦) 사이에 천하를 다투었던 이른바 초한전쟁(楚漢戰爭)은 5년간이나 지속되다가 드디어 유방의 승리로 끝났다.
항우는 해하(垓下)라는 곳에서 유방군에게 포위되었는데 밤에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사면초가 참조). 항우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800명의 기병을 인솔하고 포위망을 뜷었다. 항우가 해하를 건넜을 때는 그의 수하에 백여 명 밖에 남지 않았고 동성(東城)에 이르렀을 때는 자신을 포함해 28명밖에 남지 않았다. 항우는 이 28명을 4대로 나누어 돌진하여 수없이 많은 한군을 사살하고 다시 뭉쳐 포위망을 뚫고 계속 동쪽으로 도주했다. 이 전투가 바로 유명한 동성쾌전(東城快戰)인데, 여기에서 항우의 부하들은 단 2명이 죽었을 뿐이다. 일행 26명이 오강(烏江) 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오강의 정장(亭長)은 이미 배까지 구해 놓고 항우에게 말했다.
" 강동이 작다고 하지만 아직 천 리 땅이 있고 몇 십만 민중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도 왕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그러나 항우는 웃으면서 대꾸하였다.
"내가 당초 강을 건너 서쪽으로 진군하면서 이끌고 간 8천 명 중 지금 살아남은 이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이제 무슨 면목으로 강동의 노인장들을 대하겠는가?"
이렇게 말한 뒤 그는 타고 있던 말을 정장에게 선사하고 기병들에게 모두 말에서 내려 최후의 결전을 벌이도록 명령하였다. 이때 항우 혼자서 한나라 군사 몇 백 명을 베어 버렸다. 그러던 중 문득 뒤를 돌아보니 그가 잘 알고 있는 여마동(呂馬童)이라는 한나라 군대의 장군이 보이자 큰소리로 외쳤다.
"여보게, 한군은 나의 머리에 황금 천근과 고을 만 호를 걸었다니 어서 나의 수급(首級)을 가져다 바치게."
말을 마치자 항우는 배를 갈라 자결하고 말았다.
나중에 당나라의 시인 두목(803~853)이 오강을 유람하다가 그때 항우가 오강을 건너 강동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면서 <오강정>이라는 시를 지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兵家)도 기약할 수 없으니
부끄러움을 안고 참는 것이 남아다.
강동의 자제들 뛰어난 이 많으니
'흙먼지를 말아 일으키며 다시 왔을지도' 알 수 없었을 것을.
勝敗兵家不可期 (승패병가불가기)
包羞忍恥是男兒 (포수인치사남아)
江東子弟多才俊 (강동자제다재준)
捲土重來未可知 (권토중래미가지)
비록 패했으나, 힘을 키워 흙먼지를 일으키는 기세로 다시 유방과 싸웠더라면 천하를 차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항우의 자결을 애석하게 여겨 한탄한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