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 잠 깰 오 / 잠잘 매 / 아닐 부 / 잊을 망 )
글자 그대로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다"는 것이 '오매불망'이다. 보통 사랑하는 연인이 그리워서 잊지 못하는 경우에 많이 쓴다.
< 출 전 > 시경. 관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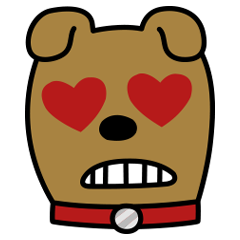
<시경> 국풍(國風) 맨 첫 편인 관저(關雎)에 나오는 말이다.
꽉꽉 우는 물새는
모래톱에 있네.
요조한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들쭉날쭉한 마름 풀을
이리저리 찿는구나.
요조한 숙녀를
자나 깨나 구한다.
구해도 얻을 수 없으니
자나 깨나 생각한다.
생각하고 생각하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네.
關關雎鳩 在河之洲 ( 관관저구 재하지주 )
窈窕淑女 君子好逑 ( 요조숙녀 군자호구 )
參差荇菜 左右流之 ( 참차행채 좌우유지 )
窈窕淑女 寤寐求之 ( 요조숙녀 오매구지 )
求之不得 寤寐思服 ( 구지부득 오매사복 )
悠哉悠哉 輾轉反側 ( 유재유재 전전반측 )
여기서 군자는 문왕(文王)을 가리키고 숙녀는 문왕의 아내인 태사(太姒)를 가리킨다. 이 시에서 얌전하고 조용한 여자라는 뜻의 '요조숙녀'란 말과 자나 깨나 구한다는 '오매구지', 자나 깨나 생각한다는 '오매사복' 이란 성구가 나오고, 또한 "전전반측" 이란 말도 나오는데, 오매불망과 비슷한 뜻이다.
공자는 후에 이 시의 아름다움을 극찬하여, <논어> 팔일편에서,
" 즐거워하되 지나치지 않고, 슬퍼하되 몸을 해치는 데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다. ( 樂而不淫 哀而不傷)"라고 하였다.
반응형
'고사성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오사필의 - 吾事畢矣 ] (0) | 2024.08.21 |
|---|---|
| [ 오부홍교 - 誤付洪僑 ] (0) | 2024.08.20 |
| [ 오리무중 - 五里霧中 ] (1) | 2024.08.16 |
| [ 오두백마생각 - 烏頭白馬生角 ] (0) | 2024.08.14 |
| [ 오두초미 - 吳頭楚尾 ] (0) | 2024.08.1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