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 이치 이 / 판가를 판 / 일 사 / 판가를 판 )
"이판승과 사판승이란" 뜻으로, 어떤 일이 막 다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 출 전 > 불교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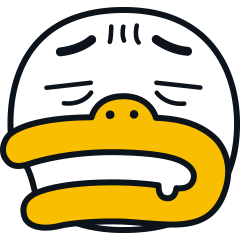
자포자기한 기분으로 결정을 내림.
조선시대 불교 승려의 두 부류인 사판승과 이판승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며 "막다른 궁지" 또는 "끝장"을 뜻하고 뾰족한 묘안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조선은 건국이념으로 억불숭유(抑佛崇儒)를 표방하였다. 이것은 고려의 지배세력이 불교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탄압 했어야 했다. 그리고 천민계급으로 전략한 승려들 또한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는데, 그 하나는 사찰을 존속 시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불법(佛法)의 맥(脈)을 잇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부는 폐사(廢寺)를 막기 위해 기름이나 종이, 신발을 만드는 제반 잡역에 종사 하면서 사원을 유지 하였다. 이런 잡역에 종사하는 승려를 사판승(事判僧) 이라고 불렀다.
한편 이와는 달리 깊은 산속에 은둔하여 참선 등을 통한 수행으로 불법을 잇는 승려들이 있었다. 이를 두고 이판승(理判僧)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 이판사판의 뜻이 전이되어 부정적 의미로 쓰이게 된 데에는 시대적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억불정책은 불교에 있어서의 최악의 상태였다. 승려는 최하 계층의 신분이었으며, 도성(都城)에서 모두 쫓겨나고 출입도 금지되어 있었다.
자연히 당시에 승려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막다른 마지막 선택 이었다. 그래서 이판이나 사판은 그 자체로 "끝장"을 의미하는 말로 전이되고 말았다. 이렇게 단순히 사찰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지던 것이 차츰 교구가 확정되고 사찰마다 주지가 책임자가 되는 제도가 정착 되면서 묘한 문제가 일어 났다고 한다.
어떤 사찰에는 이판 출신의 승려가 주지가 되고 어떤 사찰에는 사판 출신의 승려가 주지가 되는 일이 생겼던 것이다 대개 승려는 운수행각(雲水行脚)을 하면서 고행과 수도를 겸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이런 승려들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찾는 곳이 바로 산사(山寺)였던 것도 당연하다.
산사를 찾아 들어가면 주지가 그들을 맞이 하면서 대뜸 물어보는 것이 이판인가 사판인가 하는 것이었다. 물론 세속적인 욕망이나 이윤과는 거리가 먼 승려들이기에 차별이 뒤따르지 않았지만, 기왕이면 같은 판에 소속된 승려에게 정이 더 갈 것이 자명한 이치다.
때문에 산사를 찾은 운수승(雲水僧)은 그 산사의 주지가 이판승 출신인지 사판승 출신인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처신에도 유리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해서 "이판사판"이란 막다를 지경에 다다라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었을 때 자포자기한 기분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이렇게 부른다.
반응형
'고사성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이풍역속 - 移風易俗 ] (0) | 2025.04.21 |
|---|---|
| [ 이포역포 - 以暴易暴 ] (1) | 2025.04.18 |
| [ 이직보원 - 以直報怨 ] (0) | 2025.04.16 |
| [ 이전투구 - 泥田鬪狗 ] (0) | 2025.04.15 |
| [ 이일대로 - 以逸待勞 ] (0) | 2025.04.14 |





댓글 영역